
못된 건축
- 저자
- 이경훈 저
- 출판사
- 푸른숲
- 출판일
- 2014-05-08
- 등록일
- 2020-05-2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7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일까?
시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서울의 대표 건축과 도시 건축의 조건에 대하여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일까? 우리는 살면서 늘 어떤 건물에 대해 말한다. 차창 밖의 빌딩이나 동네의 신축 건물, 언론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건물들에 대해 한마디씩 평한다. 가령 광화문 광장, 서울 시청이 생겼을 때도 그랬고 최근 DDP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건축을 평하는 것일까? 단지 외향이 멋있거나 노출 콘크리트와 하이테크 기법으로 만들면 좋은 건축일까?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들의 식견에 따라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편이 맞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어떤 상식으로 건축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서울시 도시계획 의원회의 일원으로 도시를 연구하는 건축가 이경훈 교수는 2011년《서울은 도시가 아니다》이후 펴낸 두 번째 책《못된 건축》에서 도시의 건축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독해법을 알려준다. 건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건축가가 들려주는 가이드북인 셈이다. 건축과 도시,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따스하고 친절한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애매모호하게 에두르지 않는다. 서울 시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서울의 대표 건축을 콕 집어 설명하고, 서울을 살리는 건물로 DDP와 동십자각 앞의 트윈트리타워를 내세운다. 건축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건물은 랜드마크와 흉물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서울의 건축들은 대부분 도시를 무시하거나 오해한 것이다. 자신만 내세울 뿐 도시를 위해 양보하지 않았다. 새롭고 잘 된 건축으로 평가받던 이화여대의 ECC건물은 고딕양식 캠퍼스의 낭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있어야 할 모든 공간들을 지하세계로 구겨 넣었다고 비판하고(7장 158p), 국가대표급 아파트인 반포 래미안 아파트 단지는 서구에서는 이미 몇 십 년 전에 사장된 철학인 ‘전원도시’에 대한 환상을 21세기 서울에서 구현한 사례로 지목한다(8-1장 178p). 그 결과 거리가 텅 비게 되었다는 것이다. 거리를 흉내 낸 대형 쇼핑몰이 진짜 도시의 거리를 집어삼키는 모습에 대한 묘사(6장 132p), 개선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듯 펼쳐져 있는 파리 도심 건축과 국보 1호 남대문을 둘러싸고 저마다 미스코리아처럼 포즈를 잡는 건축들을 비교(3장 68p)는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 머리에 그려진다.
산중에 있는 사찰 등에서 가져온 전통의 건축의 방식을 도심의 건축물에 접목하려는 전통에 대한 강박이 낳은 폐단도 꼬집는다(2장 46p, 9장 226p). 도심을 윤택하게 만들 것으로 각광받는 옥상정원이 사실은 거리와 떨어져 있어 폐쇄적이고 건물 지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도시적이지 않다고 하고(10장 250p), 각자의 사정인 것 같았던 발코니 확장이 불러온 아파트 도면의 변형이 얼마나 암울한 도시의 그림자를 만드는지도 언급한다(8-2장 196p). 우리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건축이 도시의 삶을 망치는 사례들이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조곤조곤한 저자의 태도다. 못된 건축을 말하면서 헐뜯지 않는다. 오히려 건축에 깃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주고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건축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일까. 본문 속 팁을 통해 건축가를 대하는 법도 별도로 작성해놓았다. 건축을 도시의 관점에서 읽는 시선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같다. 저자가 그토록 도시적 건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단순히 건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도시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못된 건축’을 나열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중년 건축가의 따스한 마음이 더 진하게 다가온다.
한줄평
| 번호 | 별점 | 한줄평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수 |
|---|---|---|---|---|---|
|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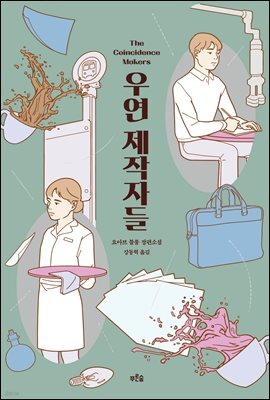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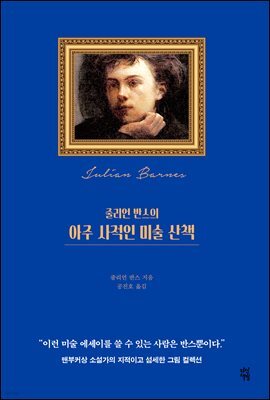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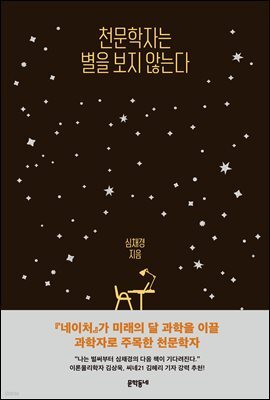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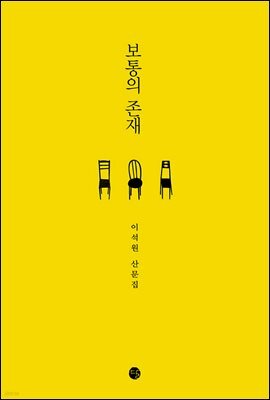

![[합본] 닥터 지킬 앤 하이드 (전2권/완결)](https://image.yes24.com/goods/92322562/L)